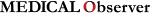올해 경평 생략 1개, 허가평가협상 1개, RSA 7개 급여화
환자단체 "체감 안돼"···제약계 "기준 도리어 까다로워져"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신약 접근성 개선 위한 신속 등재 제도의 적용 대상이 손에 꼽을 만큼 적어 환자 체감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희귀·난치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희귀·난치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규 등록 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약 급여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허가평가협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중증(암), 희귀·난치질환 관련 신약의 급여를 최대 90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환자의 취약한 신약 접근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신약이 출시된 이후 1년 이내에 국내 시장에 나오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 이웃인 일본 32%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은 "국내 희귀의약품 도입 속도는 OECD 국가의 30위권으로 최하위"라며 "여기에 보험 등재까지 평균 26개월, 최대 87개월 이상 추가 소요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신속 등재 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험분담제(RSA), 경제성 평가 생략(경평 생략), 약가협상 생략, 허가평가협상 등이다.
그러나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제도 대상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아 접근성 개선을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희귀·난치질환 중 치료약이 있는 경우는 5%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급여화된 것은 그중에서도 5%에 불과하다"며 "급여화가 돼야 실제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일단 국내 도입된 신약들만이라도 제도를 활용해 시급히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신속 등재 제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경평 생략을 통해 급여에 성공한 약은 국내 도입 2년 차인 담관암 치료제 한독 페마자이레(성분명 페미가티닙)가 유일하다. 경평 생략 적용 약물은 2023년 8개에서 2024년 5개, 2025년(8월 기준) 1개로 줄었다.
내후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둔 허가평가협상은 레코르다티코리아 콰지바(디누툭시맙베타) 입센코리아 빌베이(오데비시바트) 중 콰지바 1개만 급여화에 성공했다.
다만, RSA의 경우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 빈다맥스(타파미디스), 텝메코(테포티닙) 등 7개가 올해 통과했다.
전문가들 "수동적 제도 넘어 적극적 정책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등재를 위해서는 제약사의 등재 신청과 충실한 자료제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사의 급여 신청 없이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없다"며 "고가 약물로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제약사의 완결성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계에서는 신속 등재 제도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경평 생략 기준이 개편되면서 대상 환자 수 기준이 200명 이하로 축소됐으며, RSA 위험분담제 환급기준인 예상 청구액 비율과 계약기간도 불리해졌다"며 "최근에는 경평 생략 신청 시 실사용 자료 수집(RWD) 사후평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는 까다롭고 규모는 작은 국내 시장을 제약사가 이예 포기해 버리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신약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약 심사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며 "한국 시장이 허가와 급여 조건이 까다로워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폐고혈압학회 정욱진 회장도 "폐동맥고혈압의 1차 치료제인 에포프로스테놀 경우 글로벌 허가 30년이 지나도록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제약사 입장에선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환자를 위해 낮은 약가와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하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신속 등재 제도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김기범 교수(소아청소년과)는 "환자 규모가 작은 희귀질환 치료제일수록 자본의 논리에서 국내 시장이 밀리게 된다"며 "중요한 약들은 제약사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진출과 등재를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