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타글리플로진, SGLT-1/2 이중 억제제로 심부전 적응증 허가
콩팥병 동반 당뇨병 환자 SCORED 2차분석 결과,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낮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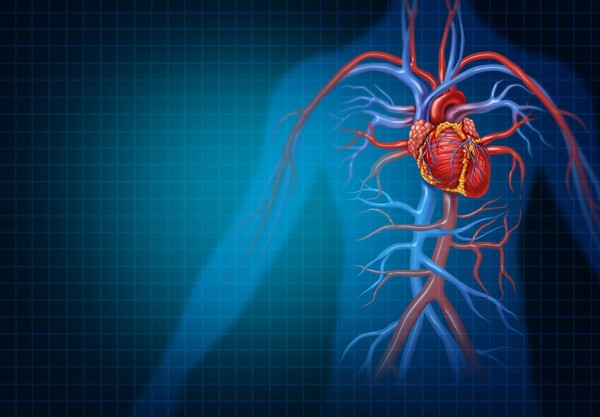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미국 렉시콘 파마슈티컬스사의 SGLT-1/2 이중 억제제 소타글리플로진(제품명 인페파)이 기존 SGLT-2 억제제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과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이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을 낮췄지만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등 개별적인 허혈성 사건에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조사된 반면, 소타글리플로진은 이 같은 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혜택을 입증했다.
이는 만성 콩팥병 동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타글리플로진의 SCORED 임상연구 2차 분석에서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2월 14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심근에서 SGLT-1 발현…"SGLT-1 선택성 있는 약이 심장에 좋을 수도"

소타글리플로진은 2023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박출률 보존 및 감소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받은 SGLT-1/2 이중 억제제다.
SGLT-1/2 이중 억제제는 SGLT-2 수용체에 선택성이 높은 SGLT-2 억제제와 비교해 SGLT-1 대비 SGLT-2에 대한 선택성이 약하다. SGLT-1 수용체는 SGLT-2 수용체와 달리 심근에서 발현된다고 보고된다.
정상 또는 허혈성, 비대성인 사람 심장으로 조직 생검을 진행한 결과, 정상 또는 병리적 상태에서는 SGLT-2 수용체 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SGLT-1 수용체는 정상 심근조직에서 발현됐고 허혈성 및 비대성 심장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했다.
즉 SGLT-2 수용체가 심근조직에서 발현되지 않아, SGLT-2 억제제는 직접적으로 심근조직의 SGLT-2 수용체를 억제해 심장 보호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된다.
반면 심근조직에서 SGLT-1 수용체가 발현됐고 허혈성 및 비대성 심장에서 증가했기에, SGLT-1 수용체가 잠재적으로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메타분석에서는 SGLT-1/2 이중 억제제가 심부전 환자에게 더 치료 혜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SGLT-2 선택성이 높은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얼투글리플로진 등과 상대적으로 선택성이 낮은 카나글리플로진과 소타글리플로진을 비교한 메타분석 결과, 심부전 환자군에서 소타글리플로진이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 심부전 환자군에서 SGLT-2 선택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SGLT 억제제를 투약한 환자군은 선택성이 높은 SGLT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군보다 MACE 위험이 25% 유의하게 낮았다(Cardiovasc Diabetol 2023;22(1):290).
강북삼성병원 이은정 교수(내분비내과)는 "SGLT-2 수용체는 주로 신장에서 확인되고 SGLT-1 수용체는 심근조직에서 발현된다. 소타글리플로진은 SGLT-2뿐 아니라 SGLT-1 수용체에도 선택성을 갖고 있다"며 "논란이 있지만 SGLT-2보단 SGLT-1에 선택성이 있는 치료제가 심장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SCORED 2차분석 결과, 심근경색 32%↓·뇌졸중 34%↓
"소타글리플로진 혜택, 기존 SGLT-2 억제제와 달라"

이런 가운데 SCORED 연구 2차분석은 소타글리플로진의 심혈관 혜택에 힘을 더했다.
사전에 계획된 이번 연구는 소타글리플로진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허혈성 사건을 개선하는지 평가하고자 진행됐다. 44개국 750곳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만성 콩팥병 동반 2형 당뇨병 환자 1만 584명이 연구에 모집됐다.
전체 환자군은 소타글리플로진군(5292명)과 위약군(5292명)에 1:1 무작위 배정됐다. 중앙값 나이는 69세였고 여성이 44.9%를 차지했다.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군은 48.6%를 차지했으며, 19.9%는 심근경색, 8.9%는 뇌졸중, 22.4%는 관상동맥 재관류술 병력이 있었다.
사전에 정의한 2차 목표점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 등을 종합해 평가한 MACE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심근경색과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100인년당 MACE 발생률은 소타글리플로진군 4.8건, 위약군 6.3건으로 소타글리플로진군의 위험이 23% 유의하게 낮았다(HR 0.77; 95% CI 0.65~0.91). 이 같은 결과는 하위군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감소 결과다. 100인년당 심근경색 발생률은 소타글리플로진군 1.8건, 위약군 2.7건으로 소타글리플로진군의 위험이 32% 의미 있게 낮았다(HR 0.68; 95% CI 0.52~0.89). 뇌졸중 발생률 역시 각 1.2건과 1.8건으로, 소타글리플로진군에서 34%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HR 0.66; 95% CI 0.48~0.91).
연구를 진행한 미국 시나이 아이칸의대 Deepak Bhatt 교수는 "소타글리플로진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각각 낮춘 최초 SGLT 억제제"라며 "소타글리플로진이 신장과 장, 심장, 뇌에서 발견되는 SGLT-1 수용체와 신장에서 발견되는 SGLT-2 수용체를 함께 차단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혜택은 SGLT-2 억제제에서 보이는 이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소타글리플로진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기존 SGLT-2 억제제와 다른 장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림대 성심병원 조상호 교수(순환기내과)는 "기존 SGLT-2 억제제는 심근경색을 타깃한 연구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론적으로는 SGLT-2 억제제가 혈관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소타글리플로진은 이번 연구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낮췄다. SGLT-2 억제제의 계열 효과(class effect)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소타글리플로진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심부전과 당뇨병에 적응증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두 가지 SGLT-2 억제제가 양강체제인 가운데, 새로운 심부전 치료제가 등장한다면 이번 연구와 같이 차별화된 데이터를 갖고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