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심장협회, 심혈관-신장-대사(CKM) 증후군 개념 제안
국내 조사 결과, 가장 악화 상태인 4단계 연평균 변화율 증가
中 연구 결과, 중년 및 고령 10명 중 9명이 CKM 증후군에 해당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심혈관과 신장 그리고 대사 등 질환이 연결됐다는 개념을 반영한 심혈관-신장-대사(CKM) 증후군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CKM 증후군은 2023년 미국심장협회(AHA)가 제안한 개념으로, 총 5단계로 분류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CKM 증후군은 미국 외 지역에서 폭넓게 연구되지 않았던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팀이 우리나라의 장기간 유병률 추세를 분석했다.
최종 결과에 따르면, 2011~2021년 건강상태가 가장 악화된 상태인 CKM 증후군 4단계의 연평균 변화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연구 결과는 The Lancet Regional Health 2월호에 실렸다(Lancet Reg Health West Pac 2025:55:101474).
아울러 중국에서는 중년 및 고령 10명 중 9명은 CKM 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조기 진단 및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美AHA, CKM 증후군 5단계로 분류
CKM 증후군은 AHA가 심혈관과 신장, 대사 건강이 서로 연관됐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2023년 도입한 개념이다. AHA는 병태생리와 위험 스펙트럼, 예방 및 치료 최적화 기회 등을 반영해 CKM 증후군을 총 5단계로 구분했다.
0단계는 CKM 증후군의 일반적 위험요인이 없는 단계다. 체질량지수(BMI)가 23kg/㎡ 미만으로 정상이고 허리둘레가 여성 80cm 미만·남성 90cm 미만이며 대사 위험요인이 없거나 만성 콩팥병 증상이 없다.
1단계는 BMI가 23kg/㎡ 이상 또는 허리둘레가 여성 80cm 이상·남성 90cm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비만인 단계다.
2단계는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대사 위험요인이 있거나 중등도~고위험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3단계는 무증상 심혈관질환 또는 중증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PREVENT 계산식으로 평가한 10년 내 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0% 이상으로 고위험인 경우로 정의한다.
4단계는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과도한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비만 등 추가 위험요인이 있는 중증 만성 콩팥병 단계를 뜻한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김상현 교수(순환기내과)는 "최근 심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대사질환이 연결됐다는 CKM 증후군이 주목받고 있다. 비만 관리를 통한 2차적 건강 증진에 더해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 악화를 막고 신장질환도 예방하자는 것으로, 종합적 접근을 강조한 개념"이라며 "CKM 증후군 5단계를 제시한 진료지침은 아직 없지만 이를 활용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취약계층일수록 CKM 증후군 진행 단계 유병률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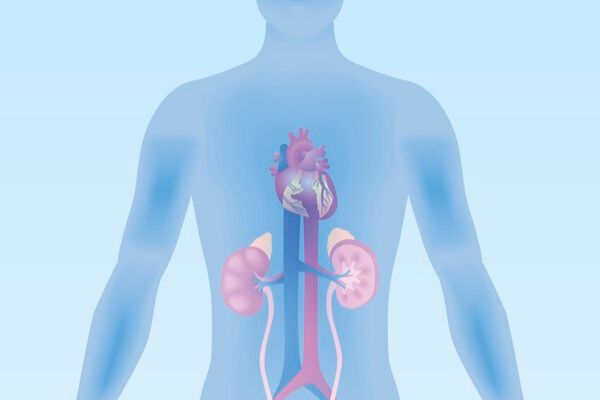
CKM 증후군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수행됐고, 아시아인 등 특정 인종에서 진행된 연구는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경희의료원 연동건 교수(디지털헬스센터) 연구팀은 2011~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한 20세 이상 성인 6만 1106명 데이터를 토대로 CKM 증후군 단계별 연령 표준화 유병률과 연평균 변화율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CKM 증후군 2단계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단계 25.4%, 0단계 21.1%, 3단계 7.3%, 4단계 2.8%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결과는 11년 동안 CKM 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되는 상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CKM 증후군 4단계의 연평균 변화율은 3.2%로 증가했고 3단계는 1.6%, 2단계는 0.7% 늘었다. 반면 1단계와 0단계는 각각 -0.2%와 -1.9% 감소했다.
연령에 따라서는 CKM 증후군 0단계 유병률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했으나 4단계는 증가했다. 특히 CKM 증후군 3단계는 50~60세에서 가장 높았다. CKM 증후군이 진행된 단계의 유병률 증가는 남성, 농촌 거주자, 흡연자, 음주자, 비만뿐 아니라 낮은 교육수준, 낮은 가계소득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수록 두드러지게 관찰됐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CKM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심혈관계 사건을 예방하고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중재가 필요하다"며 "특히 CKM 증후군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대사 위험요인의 진행을 막는 공중보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中 45~85세, CKM 증후군 1~2단계 '63.6%'·3~4단계 '26.5%'
중국에서 진행된 CKM 증후군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도 CKM 증후군 진행을 막기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중국 베이징대 인민병원 Qi Huang 박사 연구팀은 중국 코호트 연구인 Pinggu, CHARLS, 3B 등 3가지를 토대로 CKM 증후군 유병률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CKM 증후군 유병률은 미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진행 단계가 높은 CKM 증후군 유병률이 더 높았다. 이는 2형 당뇨병이 CKM 증후군 단계 정의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CKM 증후군 진행을 막으려면 2형 당뇨병을 조기 관리하는 중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JACC Asia 2025;5(1):116~118).
이어 중국 푸단대학 Hui Zhang 교수 연구팀은 JACC: Asia 2월 11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45~85세에서 CKM 증후군 단계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CHARLS 코호트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CKM 증후군 1~2단계 유병률은 63.6%, 3~4단계는 26.5%로, 중국 중년 및 고령의 약 90%가 CKM 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교수는 "중국의 중년 및 고령에서 CKM 증후군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다. CKM 증후군 진행을 막고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 등 대사 위험요인을 타깃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CKM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 개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