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ST 2024] 5개국 데이터로 면역관문억제제-혈전색전증 연관성 분석
면역관문억제제군, 1년 이내에 폐색전증 발생률 17%…비치료군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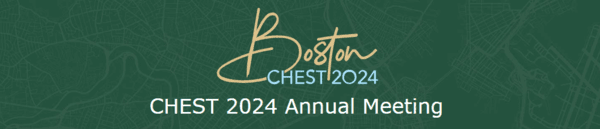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면역관문억제제로 치료받는 전이성 폐암 환자에서 혈전색전증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익명화된 환자 전자건강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면역관문억제제로 치료받는 전이성 폐암 환자에서 폐색전증 등 혈전색전증 발생률이 치료받지 않은 이들보다 높았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전이성 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시 혈전색전증 징후와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는 6~9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미국흉부의사협회 연례학술대회(CHEST 2024)에서 발표됐다.
면역관문억제제군 폐색전증 위험 1.2배↑
PD-1 억제제 폐색전증 위험이 PD-L1 억제제보다 높아

연구를 진행한 미국 에모리의대 Cosmo Fowler 교수는 "면역관문억제제, 특히 PD-1과 PD-L1 억제제는 지난 10년 동안 폐암 치료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며 "많은 면역 관련 이상반응이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와 연관됐지만, 해당 치료제를 투약하는 전이성 폐암 환자에서 혈전색전증 사건을 분석한 보고는 많지 않았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익명화된 환자 전자건강기록 데이터인 TriNetX Research Network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진행됐다. 2014년 9월~2023년 9월 전이성 폐암을 진단받은 1만 554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이 중 1630명은 최소 1회 PD-1 억제제를, 434명은 최소 1회 PD-L1 억제제를 투여받았다(면역관문억제제군). PD-1 억제제는 리브타요(성분명 세미플리맙), 옵디보(니볼루맙),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PD-L1 억제제는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또는 임핀지(더발루맙)를 투약했다.
19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동반질환 변수를 고려한 1:1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전이성 폐암 진단 후 1년 이내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심근경색, 뇌혈관 사건 등을 포함한 정맥 및 동맥 혈전색전증 사건 발생률을 조사했다.
먼저 성향점수매칭 전 모든 사건 발생률은 면역관문억제제군이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약하지 않은 비치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심부정맥혈전증 발생률은 면역관문억제제군 20%, 비치료군 13.1%로, 발생 가능성은 면역관문억제제군이 1.7배 유의하게 높았다. 폐색전증 발생률은 각 17.7%와 10.8%로 면역관문억제제군의 위험이 1.8배, 심근경색은 각 11.6%와 6.5%로 위험이 1.9배, 뇌혈관 사건은 각 10.9%와 8.3%로 위험이 1.3배 의미 있게 높았다(모두 P<0.001).
이어 성향점수매칭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발생률은 면역관문억제제군 19.3%, 비치료군 17.9%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폐색전증 발생률은 면역관문억제제군 17%, 비치료군 14.6%로 면역관문억제제군의 위험이 1.2배 의미 있게 컸다(P=0.033). 심근경색 발생률은 각 11.1%와 9.3%(P=0.058), 뇌혈관 사건은 각 10.4%와 12.5%(P=0.026)로 조사됐다
면역관문억제제 종류에 따라서는 PD-1 억제제 치료군의 폐색전증 발생률이 20.3%, PD-L1 억제제 치료군이 14.3%로 PD-1 억제제 치료군 위험이 1.5배 유의하게 높았다(95% CI 1.1~1.2). 하지만 심부전맥혈전 발생률은 PD-1 억제제 치료군 22.9%와 PD-L1 치료군 19.6%, 심근경색은 각 12.4%와 13.8%, 뇌혈관 사건은 각 12.2%와 13.1%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owler 교수는 "면역관문억제제로 치료받는 전이성 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혈전색전증 징후와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시판 후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면역관문억제제의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을 이해하면서 환자가 안전하게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