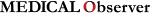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잘못된 판단에 따른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들이민 카드마저 매번 같았다.
최근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는 지난 6월과 같은 패턴이었다.
보험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청회를 수단으로 택한 것도, 그리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배재하고 공급자단체도 단 한 명으로 추린 것도 다르지 않았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실손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같았다. 이날 참석한 각계의 패널과 주제발표자들은 커져만 가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원인을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갔다.
또 실손보험사들의 보험 설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의 무분별한 비급여진료 때문이라 호도하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실손보험을 유지하지 못해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포장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비급여진료를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도 했다.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일 뿐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은 의료행위를 두고 마치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양 몰아간 것이다.
이날 의료계는 외로울 뿐이었다. "지난 6월 공청회 이후 5개월여의 시간 동안, 그때나 오늘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공청회 역시 비급여가 타깃인 것 같다"며 "문제는 실손보험 구조 설계 그 자체에 있다"고 외치는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안쓰러울 정도였다.
보험업계는 진심으로 실손보험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공정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준비를 했어야 했다.
“보험사만의 이득을 대변하는 금융당국 헛발질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궁금하다.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며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보험사 자신들의 내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귀띔한 한 참석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