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1주년 기념 특별 대담] 미국 카이저 퍼머넨테 다우니 메디컬 센터 Dr. Vincent Minsoo Han과 국제성모병원 송명제 교수가 만나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 2020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의료계와 정부는 ‘임세원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의 목을 낫으로 베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술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려 화재가 발생했다.
임세원법이 만들어진 후 “하겠다”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는 부족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의사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미국 응급실 시스템을 알아보고, 어떤 부분을 배우고 개선해야 할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담에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카이저 퍼머넨테 다우니 메디컬 센터(Kaiser Permanente Downey Medical Center)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는 Dr. Vincent Minsoo Han(한민수)과, 국제성모병원 송명제 교수(응급의학과)가 참여했다.
Dr. Vincent Minsoo Han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의대 졸업 후 마운트 사이나이의대 베스 이스라엘(Beth Israel) 메디칼센터에서 수련받았다.
이후 독일 란스툴레 미군 지역의료센터에서 응급실 부실장, 주한 미군에서 응급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카이저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송명제 교수는 가톨릭관동의대를 졸업한 후 분당차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주역이기도 하다.
미국은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 매우 강해
송명제 교수(이하 송): 최근 국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응급실 상황은 어떤가?
한민수(이하 한): 미국에서도 의사가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 이들이 총이나 칼을 쓰기도 하고, 침을 뱉거나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 갱(gang)들이 응급실에 들어와 싸우는 일도 벌어진다.
미국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벌이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된 편이다. 그래서 의사가 다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이 매우 강하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이 경찰을 부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 구속할 수 있다.
만일 상해를 입힌 사람이 환자라면 진료받고, 그 이후 경찰서로 데려간다. 한국보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의료진이 덜 다치는 또 다른 이유는 보안요원 숫자일 듯하다. 내가 있는 병원만 해도 수십 명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한다.
송: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 병원에 보안요원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안요원 외에 의료진이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또 있나?

한: ‘코드 그레이(Code Grey)’가 잘 작동되는 편이다.
환자 심장이 멈추면 모두 뛰어들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응급실에서 의사나 누군가 위협을 느꼈을 때 ‘코드 그레이’를 외치면 보안요원, 의사, 병원 근무자 등이 모두 뛰어와 위험을 가한 사람을 제압한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해 이와 관련된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도심에 위치한 큰 병원들은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 공항 출입에 사용되는 보안대를 만들어 놨다. 환자들이 총이나 칼 등 흉기를 들고 응급실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코드 그레이'
송: 응급실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부족한데 환자는 많기 때문이다. 미국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근무 시간은 어떤지, 또 어느 정도 환자를 진료하는지 궁금하다.
한: 도시와 시골, 병원 크기마다 모두 다르지만, 보통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36시간 일한다. 주중 혹은 밤 등의 로테이션으로 일하면 된다.
우리 병원은 응급실에 100병상이 있다. 의사 7~8명이 같이 진료하는데, 1년에 약 10만명을 본다. 응급실에서 패스트 트랙, 미드 트랙, 노멀 트랙 등으로 나눠 보통 중간 정도 환자들 볼 때 20명 정도 진료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빨리 진료해야 할 때는 30명 정도 본다. 그 정도면 많이 봤다고 얘기한다.
송: 우리나라도 지역과 병원 크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근무 시간은 얼추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진료하는 환자 수는 너무 적어 깜짝 놀랐다. 우리 병원 응급실은 28병상인데, 1년에 4만 5000명 정도 진료한다. 우리 병원이 3분의 1 정도 병상임에도 환자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
최근 월요일 나이트 근무 때 하루(24시간) 동안 161명 환자를 진료했다. 28병상이니까 161명이 로테이션 됐다는 얘기다. 2~3시간에 1명씩 환자를 보는 것이다.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빨리 진료한다. 같이 진료하는 팀원도 부족하다. 낮에는 전문의 1명, 저녁에는 전문의 2명, 전공의 1명씩이 함께 했다. 레지던트와 인턴까지 합해도 3~4명이 근무한다.
한: 코로나19(COVID-19) 이전에는 응급실에서 커튼을 치고 환자를 진료하는 오픈 병상이었다.
그러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100병상 중 10개를 제외하고 모두 1인 음압 병실로 바뀌었다. 한국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송: 국제성모병원 응급실에는 음압 병실이 4~5개 있다. 이제 중환자실이 1인실로 구역을 나누는 정도라 응급실을 1인실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 우리나라 응급실은 어떤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코로나, 이후 음압병동이 만들어지는 등 경로를 밟고 있다.
미국도 응급실은 쉽게 올 수 있어 환자로 북적
송: 우리나라 응급실이 늘 환자로 붐비는 이유는 환자들이 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서다. 미국 상황은 어떤가?
한: 미국도 마찬가지다. 응급실 방문 환자 중 진짜 급한 환자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 60%는 아파서, 나머지 30%는 편리해 응급실을 방문한다.
미국은 큰 병원을 방문하려면 우선 주치의를 만나야 하고, 이후 검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 다시 병원을 방문해 스페셜리스트(전문의)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1~2주 걸린다.
반면, 응급실에선 한 번에 모든 걸 진행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환자들이 많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은 비용이 들지 않아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 찾기도 한다. 물론 자기 비용을 내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도 많다.
미국, 응급실 전 단계인 'Urgent Care' 운영
송: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 응급실 문턱이 아주 높은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놀랍다.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Urgent Care’와 응급실 내에서 가동되는 ‘Fast Track’은 무엇인가?
한: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오기 위해 밖에서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냈는데 진료를 이따위로 하냐”는 등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Urgent Care다. 환자들이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주말이나 밤늦게까지 상주한다.
의사들이 기초검사 등을 통해 빨리 응급실로 들여보내야 하는 환자인지 아닌지 등을 구별한다.
응급실에 긴급하지 않은 환자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Fast Track은 타박상 등 가벼운 증상일 때 응급실 옆에 있는 Fast Track 방에서 환자를 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응급실에 환자가 많을 때 가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래대로 응급실에서 진료한다.
인력이 더 필요해 의사를 한 명 더 쓰기도 한다. 또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 프랙티셔너(Nurse Practitioners, NP) 등이 이 역할을 맡기도 한다.
송: 우리나라 실정과 달리 미국은 세분화가 잘 돼 있어 전 단계 처치가 잘 이뤄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비응급 환자는 조금 늦게 진료하고, 응급환자는 빠르게 진료하는 과정을 갖추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국민 인식 바꾸는 캠페인 해야
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다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송: 응급실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만 강화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대부분 벌금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됐다. 이후 2017년에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법안을 강화하니까 난동 횟수는 줄었지만, 흉악범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의사가 1차 가해를 입지만, 그 의사는 다른 환자도 진료하지 못하게 된다. 응급상황에서 진료받기 위해 응급실에 왔는데 진료를 못 받게 되면 다른 환자가 2차 가해를 입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부가 캠페인을 안 한다. 국민의 인식이 좋아져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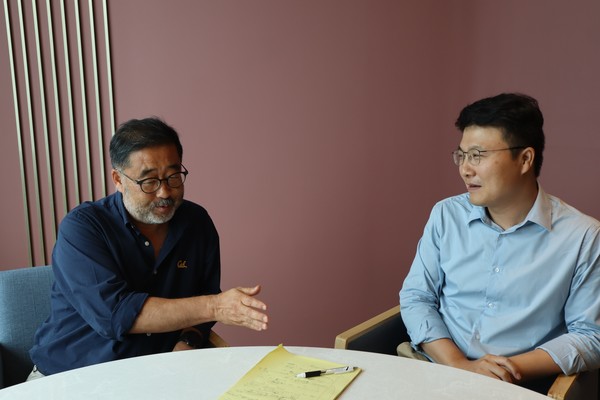
송: 국내에서 응급의학과는 힘들고, 개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비인기과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지금은 중~하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응급의학과 인기는 어떤가?
한: 미국도 새로운 세대들이 워라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버 타임 근무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피부과, 안과, 방사선과 등이 인기가 좋다. 공부 많이 안 하고 편한 진료과를 선호한다.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한 응급의학과 인기도 많이 상승했다.
전체 진료과 중 중간~상 정도. 또 퇴근 후 계속 살펴야 하는 환자가 없어 일단 자유롭다. 일주일에 36시간 일하면 되니까 3일 일하고 4일 쉬기도 하고, 한 달 중에서 열흘 일하고 여행을 갈 수 있어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인기과에 속한다.
송: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레지던트보다 삶의 질(QOL)이 높아 응급의학과를 지원했다고 한다. 지원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비인기과라는 사실은 씁쓸하다.
미국은 응급의학과 인기... 한국은 글쎄
국내에서 비인기과인 첫 번째 이유는 개원하기 쉽지 않아서다. 다른 진료과는 수련받고 2차 병원에서 봉직의로 진료하다 개원하는데, 응급의학과는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나이 들면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기 어렵다는 점이다. 50 · 60대에도 밤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인기가 없다. 다른 진료과보다 적은 수입도 비인기과인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10년간 의원급 표시과목별 근무의사의 연 평균 임금 현황을 공개했다. 여기에 응급의학과는 나오지도 않았다.
한: 우리 병원은 50~60% 정도가 58세 정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오픈 시프트가 많아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송: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인턴 수련을 받는다. 미국은 인턴제도가 없는데, 인턴 때 배워야 하는 술기는 언제 배우는지 궁금하다.
한: 나도 1~2학년 때 책으로 공부하고, 3~4학년 때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1학년 부터 환자 전체를 보면서 생물학, 병리학 등을 배운다. 우리 병원 응급실에 의대 1학년이 실습을 와 정맥주사(IV)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시킨다. 학생 때 여러 진료과를 경험하고 4학년 때 진료과를 결정한다.
송: 국내에서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처치해도 난리가 난다. 의사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환자에게 IV를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산부인과 실습하러 갔을 때 트레이닝 병원이였지만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등 환자와 대면하는 건 쉽지 않다.
응급실에서도 IV나 봉합 등을 시켜보려고 해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턴이 되면 혈액 채취나 동맥혈가스분석(ABGA) 등만 계속한다. 개인적으로 인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제일 필요한 의사”
송: 주니어 교수인 내가 후배들에게 “환자에게 친절해야 한다” 혹은 “환자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등의 얘기를 한다. 하지만 정작 내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웃음).
간혹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환자들이 있다. 내공이 많은 선생님은 연륜으로 알지만 나처럼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질병, 해부학 등 신체적 질병만 찾아내려 한다.
한: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의사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됐다. 사망할 수도 있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이다. 물론 회의를 느낄 때도 많다. 지금 돌아보면 초기에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몸이나 기전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정작 응급실에는 분노가 있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오고, 부부싸움 했는데 배가 아프다고 온다. 은퇴를 앞둔 지금 생각해보면 환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환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래야 부부싸움 후 배 아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웃음).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에게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스승의 역할을 송 교수 또한 폭넓게 해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