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구팀, 유전적 위험 요인에 따른 간 섬유화 중증도 변화 분석
40대 이상이면서 PNPLA3 G/G 변이 있으면 간 경직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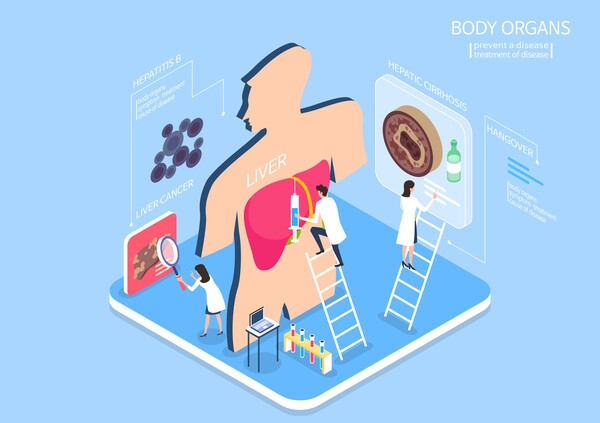
[메디칼업저버 손재원 기자]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 환자의 유전자형을 분석해 나이에 따른 간 섬유화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Luis Antonio Diaz 박사 연구팀은 기본적인 유전자 검사와 MASLD 관련 검사를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유전자 변이에 따라 MASLD에서 간 섬유화 중증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년 단위로 정량화하고자 했다.
해당 연구는 18~70세 MASLD 성인 환자를 모집해 자기공명탄성촬영(MRE)과 함께 PNPLA3, TM6SF2, MBOAT7, GCKR, HSD17B13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간 섬유화에 대한 유전적 위험 점수(GRS)는 PNPLA3에서 확정된 위험 대립유전자의 총합에서 HSD17B13의 보호 변이를 제외한 값으로 정의했다. 결과값 0은 저위험, 1은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또 다중 유전적 위험 점수-간 지방 함량(PRS-HFC)과 조정된 위험 점수(PRS-5)도 함께 측정했다.
1차 목표점은 간 섬유화에 대한 유전적 위험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MRE로 측정한 간 경직도 측정 수준(LSM)의 연령별 변화로 정해졌다.
연구에 참여한 570명의 환자에서 나이 중앙값은 57세였고 여성이 56.8%를 차지했다. 34.2%는 히스패닉계였다.
MRE 측정 결과 중앙값은 2.4kPA였고 51%는 유전적 위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위험 점수가 높은 군(고위험군)에서 간 경직도 수준은 10년 단위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졌다(β=0.28kPa; 95% CI 0.12~0.44; P=0.001)
반면 유전적 위험 점수가 낮은 군(저위험군)에서는 이런 경향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다중 유전적 위험 점수-간 지방 함량과 조정된 위험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이 PNPLA3 유전자 변이만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을 때도 간 경직도 측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C/G 변이의 경우 β값은 0.32kPA로 나타났고(95% CI 0.02~0.61; P=0.034) G/G 변이에서는 β값이 0.87kPA로 보고됐다(95% CI 0.52~1.22; P<0.0001). 특히 G/G 변이의 경우 44세까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간 경직도와 유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PNPLA3 G/G 유전자 변이가 MASLD의 간 섬유화 경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경향은 40대 이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MASLD 관리를 위해 유전적인 위험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를 진행한 Diaz 박사는 "유전적 위험 점수나 PNPLA3 변이는 나이가 들수록 간 섬유화 중증도를 높이는 것과 유관했다"며 "특히 중년기에 들어서면 질병 경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MASLD에서 유전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더 잦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비침습적인 간 섬유화 평가와 치료적 개입을 위한 환자 선택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Journal of Hepatology 10월호에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