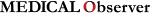누구나 쉽게 정신병을 인정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정신병원 대부분이 폐쇄병동인 것과 달리, 국립서울병원에서 오는 2016년 탈바꿈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칭) 절반 가까이가 개방병동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앞으로 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지방에 있는 공주, 나주, 부곡, 강원 등의 국립정신병원이 권역별 정신건강센터가 돼 국가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병원 운영방안, 국가 정신보건사업 개요, 그리고 앞으로 오픈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국립서울병원은 민간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결핵, 에이즈 등의 중증감염질환 동반 정신질환자나 외상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신과 환자 패턴이 조현병, 만성알코올환자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노인우울증, 치매 등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
게다가 24시간 정신건강 전용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에서 발생하는 정신과 질환을 집중해서 보는 '소아청소년진료소', 환아가 다니는 참다울 학교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외상팀을 운영해 세월호 등 각종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 환자를 위한 센터를 마련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대한 정신상담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중독자,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탈북자, 보호관찰자 등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신과에 대한 인식 잘못된 인식 팽배, 실질적인 정신과 연구 부족 등으로 잠재적인 환자들이 정신과 병원에 오는 것을 꺼리고, 일부 지역주민들도 병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로 선진국과 달리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정신과 병상수 역시 많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진료, 외래 진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 원장은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 현재 국민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 환자는 15~20% 정도"라며 "인식개선을 통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도와 극단적인 상황이나 중증질환자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식개선을 위해 국립서울병원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대부분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영상검사, 진단, 약물학 등 학술분야에 치중돼 있다. 우리는 지원받을 수 없는 분야인 사회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인식 개선 방안 마련, 우울증임에도 자살로 이어지지 않는 환자 케이스 연구,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등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

이 같은 정신사회학 연구를 비롯해 외래진료 중심, 정신과 개방병동 운영, 중앙정신건강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해 국립정신병원의 개편실행계획을 발표했고, 국립서울병원에서 지난해 11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현재 국립서울병원 바로 옆 부지에 12층 규모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며, 이는 내년 말 완공한 후 오는 2016년 3월쯤 개소할 예정이다.
그는 "마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소 두는 것처럼, 서울병원이 헤드쿼터, 컨트롤타워가 되고, 강원, 공주, 나주, 부곡 등 지역별로 있는 병원들이 강원권역센터, 충청권역센터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정신건강연구원, 병원, 국가정신건강사업본부로 구성되며, 1층은 외래 및 낮 병동, 2층은 아동청소년 병동, 3층은 지역주민, 경증질환 개방병동, 4층은 5층은 노인병상, 6~12층은 연구동으로 이용된다.
기존에 보호, 폐쇄 병동 위주에서 센터는 경증질환자를 더 많이 보고 절반 정도를 개방병동으로 꾸려지게 된다.
그는 "병동의 중증도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민간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경증질환자를 위한 치료를 실시하고, 개방병동을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추고, 정신과 병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소 만들어서 정신과 관련 가이드라인 만들고,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코호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시스템의 효율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있어야 각종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빅데이터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정신과 질환을 언제 어디서 치료받는지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바로 다음날 B병원 정신과에 입원해도 병원들은 모르는 시스템"이라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에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정신과 입원 관리를 해야 할 때"라며 "기회가 된다면, 환자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의료재정 순·역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도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치료율도 높아지고 자살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국립서울병원이 순차적으로 담을 허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정신과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