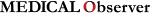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기획 하]통계로 본 개원가 10년- 열악한 개원시장…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
|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급변하는 개원가의 모습을 보면 강이 하나 새로 열리고, 산이 하나 없어지는 데 10년이나 필요할까 싶다. '개원'이 평생의 일자리를 의미하던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 개원가는 그야말로 격동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원가의 변천을 3회에 걸쳐 조명한다. [기획 상]끝 모르는 저성장 터널…깊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기획 중]피·안·성 강세 속 산부인과 '날개 없는 추락' [기획 하]전문의들, 생존 위해 '간판' 뗀다 |
2005년까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의원수를 보유했던 산부인과는 2005년 1907곳에서 2014년 말 1366곳으로 10년 사이에 541곳의 의원이 문을 닫아 -28.3%의 감소율을 보였다.

2014년 말 기준 산부인과 의원 한 곳당 연간 매출은 3억9468만원선으로, 전체 의원급 평균 3억9169만원을 근소하게 올라선 모습이다.
같은 시기 기관당 매출 상위권을 기록한 정형외과(7억4296만원)와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이어 안과 6억5864만원, 신경외과 6억1195만원, 마취통증의학과 5억1057만원, 내과 4억7026만원 등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외과 개원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외과는 2005년 1072곳에서 2014년 1022원으로 50곳이 줄어 -4.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 결과 의원수 순위도 7위에서 8위로 한 단계 밀려났다.
올해 가장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비뇨기과 또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5년 905곳에서 2009년 972곳으로 7% 성장했던 비뇨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2년부터 하향세에 들어서 2014년 말 961곳으로 5년새 12곳이 줄었다. 10년 동안의 증가율은 6.2%로 전체 의원 평균 증가율을 훨씬 밑도는 성적이다. 이에 따라 개원시장에서의 의원수 규모도 8위에서 9위로 간신히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산부인과나 외과에 비해 비교적 최근으로, 앞으로의 10년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팽배하다. 비뇨기과 의원의 2014년 말 연간 매출액은 2억8528만원으로, 전체 진료과 중 최저 수준. 비급여 진료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은 과 특성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비뇨기과는 비급여 부문이 거의 없다. 발기부전 약 처방이 비급여인데 약 처방으로 의사가 얻는 이익은 없고, 전립선비대증약을 다른 과에서 처방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그러니까 흉부외과보다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2005년 800곳에 못 미치는 의원이 문을 열고 있던 피부과는 2014년 말 1112원으로 316곳이 증가,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수직성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005년 524곳에서 2014년 말 863곳으로 339곳이 늘어 64.7%가 폭증했다. 이는 2002년 마취과에서 마취통증의학과로 개명하면서 광범위한 통증질환 환자층을 흡수한 것과 연관이 깊다.
매년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도리어 의원수가 줄어든 전문과목들, 의원 문을 닫고 사라진 전문의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답은 보드를 표시하지 않고 개원하는 '미표시 의원' 시장이 급팽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2005년 4102곳에서 2014년 5333곳으로 10년 동안 1231곳이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평균 성장치(14.8%)를 두 배가량 웃도는 30%의 성장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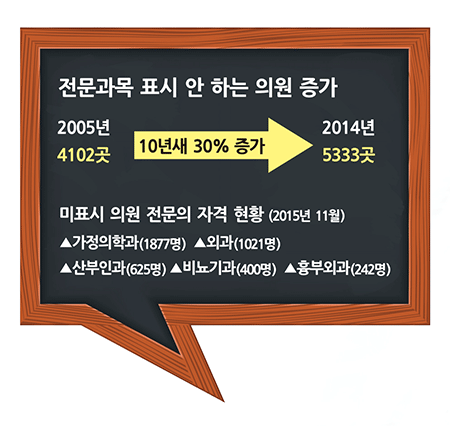
'미표시 의원' 급팽창 "이 마저도 쉽지 않다"
본지가 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표시과목 없는 의원의 전문의 자격현황'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본인의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개원 중인 전문의는 가정의학과가 18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 1021명, 산부인과 625명, 비뇨기과 400명, 흉부외과 242명 순이다.
가정의학과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전공의 지원과 개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시달린 전문과목 의사들의 행보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장용석 회장은 "예전에는 전문의 보드가 없어 표시를 안 하고 개원하던 게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전문의가 되고도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외과의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기에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추워졌다. 다들 병원 경영이 되게끔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라며 "외과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작은 외상에도 동네외과가 없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야 하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비뇨기과는 2013년 12월 348명, 2014년 12월 376명, 2015년 11월 40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52명의 전문의가 전문과목 간판을 떼는 선택을 했다. 같은 기간 외과 8명, 산부인과 19명이 늘어난 데 비해서도 급격한 증가세다.
그렇게 전문과목을 숨기고 개원한 의사들의 만족도는 올라갔을까?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 개원의는 사회 전반적인 성장 둔화와 피부미용 클리닉 분야의 경쟁 과다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어 회장은 "비뇨기과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탈출구로 피부과를 보통 선택하는데, 덤핑이 많이 들어가 그 시장도 주춤한 분위기"라며 "간판을 바꾼 동료들이 비뇨기과를 다시 열기도 어렵고, 피부과를 계속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