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ACC·AHA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기본 전략으로 최소 12개월 DAPT 권고…출혈 위험 따라 PCI 후 치료전략 다르게 제시
LDL-C 관리 위해 최대 내약 용량 스타틴 치료 더해 비스타틴 제제 병용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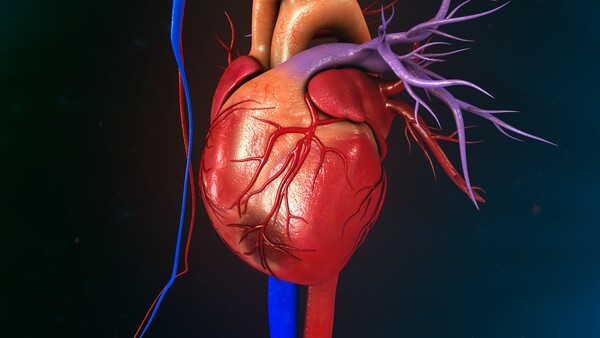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미국 심장학계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출혈 위험에 따라 맞춤형 항혈소판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치료전략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심혈관질환 2차 예방을 위한 지질 관리 전략으로 최대 내약 용량 스타틴에 더해 비스타틴 계열 병용을 권장했다.
미국심장학회·심장협회(ACC·AHA)는 미국응급의학회(ACEP), 미국응급의료지도의사협회(NAEMSP), 미국심혈관중재술학회(SCAI) 등과 함께 이 같은 권고안을 담은 '2025년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 관리 가이드라인'을 JACC와 Circulation 2월 27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과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NSTEMI) 환자 관리에 중점을 뒀다.
가이드라인 개발을 이끈 미국 뉴욕대 랑곤헬스 Sunil V. Rao 교수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급성 및 만성적으로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가장 높다"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장기간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혈 위험 높다면 DAPT 1개월 후 아스피린 또는 P2Y12 억제제 중단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자 기본적으로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 기반의 이중항혈소판요법(DAPT)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재관류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혈전성 사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만, DAPT 시 과도한 출혈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허혈 및 출혈 사건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를 활용해 개별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출혈 위험에 따라 다른 항혈소판요법 치료를 진행하도록 제시했다.

먼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기본적인 항혈소판요법 전략으로서 퇴원 후 최소 12개월 동안 DAPT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환자라면 강력한 혈소판 억제 효과를 보이는 P2Y12 억제제인 티카그렐러나 프라수그렐을 선호하도록 명시했다(Class 1).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텐트 이식 후 DAPT를 시행하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P2Y12 억제제 유지요법 시 클로피도그렐보단 티카그렐러가 합리적이라고 Class 2a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력한 P2Y12 억제제 사용에 관한 권고등급이 강해졌다.
비ST분절 상승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중 24시간 이후 혈관조영술이 예정됐고 침습적 치료가 계획됐다면,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을 줄이기 위해 클로피도그렐 또는 티카그렐러를 조기치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PCI 후 출혈 위험을 낮추는 전략으로, 먼저 아스피린+티카그렐러 병용요법으로 DAPT를 진행한 이후 내약성이 있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PCI 후 1개월 이상 지나 티카그렐러 단독의 단일항혈소판요법(SAPT)으로 바꾸면 출혈 위험을 낮추는 데 유용하다고 권고했다(Class 1).
위장관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라면 출혈 위험을 낮추기 위해 DAPT, 경구용 항응고제 또는 두 가지 약제 모두와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를 투약하도록 주문했다(Class 1).
또 경구용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라면, 출혈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스피린+P2Y12 억제제(클로피도그렐 선호) DAPT와 경구용 항응고제의 3제요법을 1~4주간 실시한 다음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SAPT+경구용 항응고제 병용요법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Class 1).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비ST분절 상승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경우 비타민K 길항제+아스피린+P2Y12 억제제 기반의 3제요법 진행 시 출혈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한 치료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3제요법 치료 기간과 이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PCI를 받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1개월 이후 DAPT 강도 감량요법이 출혈 위험을 낮추는 데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Class 2b). DAPT 강도 감량요법은 강력한 P2Y12 억제제인 티카그렐러 또는 프라수그렐에서 클로피도그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출혈 위험이 높고 PCI를 받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아스피린+P2Y12 억제제로 DAPT를 1개월 동안 진행한 이후 아스피린 또는 P2Y12 억제제를 중단하고 SAPT를 시행하는 것이 출혈 위험을 낮추는데 유용하다고 권고했다(Class 2b).
고강도 스타틴에도 LDL-C 70mg/dL 이상이면 비스타틴 제제 병용해야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심혈관질환 2차 예방을 위해 LDL-콜레스테롤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LDL-C 목표 도달을 위해 고강도 스타틴에 더한 비스타틴 계열 지질저하제 투약에도 무게를 실었다.

기본적으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질 저하 전략으로 고강도 스타틴을 권장했다. 이에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았거나 저/중강도 스타틴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고강도 스타틴을 시작해야 하고(Class 1),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Class 2b).
최대 내약 용량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LDL-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지질 관리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LDL-콜레스테롤이 55mg/dL 미만이라면, 고강도 스타틴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Class 1). LDL-콜레스테롤이 55~69mg/dL라면, 비스타틴 계열 지질저하제 병용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정리했다(Class 2a). LDL-콜레스테롤이 70mg/dL 이상이라면 비스타틴 계열 지질저하제를 병용하도록 권장했다(Class 1). 비스타틴 계열 지질저하제에는 에제티미브와 PCSK9 억제제(알리로쿠맙, 에볼로쿠맙, 인클리시란 등), 벰페도익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스타틴 불내성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라면, 비스타틴 계열 지질저하제를 추가하도록 제시했다(Class 1). 또 모든 환자군은 퇴원 후 4~8주에 지질 수치 재평가를 시행하고 목표 수치 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조정하도록 명시했다(Class 1)
복잡한 병변에 스텐트 이식 시 IVUS·OCT 유도 PCI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PCI를 시행할 경우 출혈과 혈관 합병증 그리고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퇴동맥보단 요골동맥을 통한 접근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했다(Class 1).
좌주간동맥이나 복잡한 병변에 스텐트를 이식해야 하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라면, 혈관내 초음파(IVUS)나 광간섭 단층촬영(OCT)을 사용한 혈관내 영상 유도 PCI를 진행하도록 주문했다(Class 1).
심인성 쇼크에 대한 권고안도 담았다. 심인성 쇼크를 동반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신속한 재관류술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명시했다(Class 1). 이에 더해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세축류 펌프 등 새로운 치료를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연구에서 급성 심근경색 관련 심인성 쇼크 환자는 선택적으로 미세축류 펌프를 사용하면 표준치료보다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미세축류 펌프는 일반치료와 비교해 출혈, 사지허혈, 신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미세축류펌프 진행 시 혈관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하고 펌프 중단 시에도 혜택과 위험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사망, 심근경색, 재입원 등을 줄이고 기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퇴원 전 심장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환자가 심장재활 전문기관에 방문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 기반 프로그램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