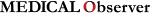바이오신약 개발에 선택과 집중, 신약개발 기대감↑
제약바이오, 암·대사질환·신경계 적응증 많아...옥석 가리기는 '필수'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바이오벤처의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성공이 국내 대형·중견 제약기업의 실적을 위협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바이오벤처는 이들보다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신약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의 바이오산업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상용화를 위한 '옥석 가리기'는 필수라는 제언도 나온다.
기술이전·파이프라인 보유, 바이오벤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한국 바이오벤처의 라이선스 아웃 비중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중견 제약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29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1000억원 미만 바이오벤처 138개사는 153건의 라이선스 아웃을 성사시켰다.
이는 대형·중견 제약기업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실제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중견 제약기업 55개사가 이 기간동안 성공한 라이선스 아웃은 23건에 불과하다.
라이선스 아웃 파트너가 글로벌 기업인 경우도 바이오벤처는 50개로, 17개에 그친 대형·중견 제약기업보다 약 3배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보유한 파이프라인에서 기인한다.
대형·중견 제약기업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은 641개에 불과했지만, 바이오벤처의 파이프라인은 836개에 달했다.
파이프라인의 차이도 있었다. 바이오벤처가 바이오신약에 집중한 것이다.실제 대형·중견 제약기업의 파이프라인 구성은 합성신약이 375개로, 141개의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보다 많았다.
반면 바이오벤처는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이 399개로 합성신약 파이프라인 224개보다 많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벤처의 경우 비용적 측면에서 신약개발 전 과정을 수행하기보다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두드러지는 단계에서의 기술이전이 현실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투자로 선순환 구조 장착...옥석 가리기는 과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2018년 제약·바이오업계 전체 파이프라인은 573개에서 올해는 1477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임상시험에 진입한 파이프라인도 같은 기간 동안 173건에서 55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임상3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은 2018년 31개에서 올해 116개로 늘어났다.
이는 투자 형태가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업체 중 116개 상장사가 작년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2조 159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매출 20조 2060억원의 10.7%에 달하는 금액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2.1%p 증가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라이선스 아웃과 상용화를 위한 파이프라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파이프라인 대다수가 항암제에 집중해있기 때문이다.
적응증별로 살펴보면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317개로 21.5%를 차지했다.
대사질환 173개(11.7%), 신경계통 146개(9.9%), 감염질환 112개(7.6%), 소화기 79개(5.3%)가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벤처의 기술성 부각은 라이선스 아웃 측면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가려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