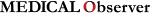초음파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초음파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사람이 의사가운을 입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간절하다.
병원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초음파 검진도 마찬가지이다. 때로 그가 의사인것 같기도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냐고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규모가 큰 병원이라고 해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초음파 검사가 결정되면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야하는 순간이 온다. 시행자가 의사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순간 차가운 젤이 몸을 덮는다.
대부분의 환자는 당연히 의사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는 곳에서 비의료인이 초음파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지원 인력(PA)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맡기거나 병의원의 경우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 등이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 인력부족이 주 이유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인력이 없서 비의사에게 넘겨줄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검사가 아니다. 초음파의 검사의 핵심은 촬영과 판독인데 수많은 경험이 없으면 쉽게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도 최근 이점을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학회 한준구 회장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많이 투명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일부 특정 센터에 가면 여러 곳에서 초음파를 하고 한 명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사인을 하는 일도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지난 7년 전 시행했던 물어보세요 캠페인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른바 초음파 검사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자는 것이다. 물어봐서 비의료인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의미의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최근 학회에서 만난 영상전문가들은 복지부가 하반기부터 만성간질환과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병의원들의 검사 경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질관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한번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거의 모든 학회에서 여는 초음파 교육 세션은 연일 만원사례다. 지난 2월 초음파의학재단 소속의 초음파의학교육원이 처음 실시한 시험 공개강좌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기를 실감했다.
초음파 검사 주최자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어쩌면 관행처럼 돼 있는 문제다. 하지만 급여를 계기로 검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 번은 풀고 넘어야 할 숙제가 됐다. 정부의 급여 조건은 의사가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느닷없이 의사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쩌면 신뢰를 깨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만큼 병원이 먼저 먼저 신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즘은 각종 인증의 수료증도 멋지게 만들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