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효과 평가에서는 비열등성 입증했으나 항생제군 10명 중 3명은 절제술 받아
부작용 위험은 충수석을 가진 항생제 군에서 5.6배가량 높은 것으로
맹장염(충수염) 환자에서 충수절제수술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항생제 치료가 단독으로는 역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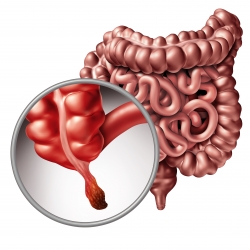
최근 발표된 임상연구에 따르면 항생제가 절제수술대비 30일 내 삶의 질 평가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지만 항생제군 10명 중 3명은 결국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또한 충수 내에서 굳어진 덩어리를 일컫는 충수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술 환자가 10명 중 4명으로 증가했다.
핀란드 투르쿠대학 Paulina Salminen 교수팀이 2015년 발표한 관찰연구를 바탕으로 항생제 치료는 맹장염의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서 충수절제수술을 대체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후 2018년에 발표된 5년간 장기추적관찰 연구에서도 항생제 단독 치료가 수술보다 부작용 위험이 더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며 비수술적 치료로서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시점 NEJM 10월 5일자 온라인판에 발표된 미국 워싱턴의대 David R. Flum 교수팀의 오픈라벨 비열등성 연구에서는 역으로 항생제 치료를 사용한 군의 합병증 위험이 2.28배 높게 나타나며 충수절제술 대체 가능성이 좌절됐다(RR 2.28, 95% CI 1.30-3.98).
Flum 교수팀은 미국의 25개의 기관에서 충수염 환자 1552명을 모집한 후 항생제군과 충수절제술군에 1:1로 무작위 배정했다. 항생제군은 1회 정맥 내 투여 후 10일간 알약을 처방받았다.
처치 후 합병증 발생률은 항생제군이 8.1%로 충수절제군 3.5%보다 2.25배 가량 높았다(RR 2.28, 95% CI 1.30-3.98).
특히 주목할 점은 참여자를 충수석 여부에 따라 나눈 하위분석에서 충수석이 있을 경우에만 항생제군의 합병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충수석이 있는 경우 항생제군의 합병증 발생률은 20.2%로 충수절제군 3.6%에 비해 5.69배 더 커졌다(5.69, CI 2.11-15.38). 이와 달리 충수석이 없는 경우에 항생제군 합병증 발생률은 3.7%로 충수절제술군 3.5%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05, CI 0.45-2.43). 심각한 유해사건은 항생제군에서 4%로 충수절제군(3%)보다 높은 경향만을 보였다(1.05, CI 0.45-2.43).
이외에도 항생제군 10명 중 3명(29%)은 처치 후 90일 이내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충수석이 있는 환자에서는 41%가, 충수석이 없는 경우에서는 25%가 충수절제술을 필요로 했다.
효과 측면 분석결과에서는 항생제군이 충수절제군 대비 비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 30일 후 실시한 유럽의 삶의 질 설문지(European Quality of Life - 5 Dimensions, EQ-5D)의 평균점수는 항생제군과 충수절제술군 각각 0.92점, 0.91점으로 0.01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팀이 설정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차이 0.05p보다 낮은 수치로 항생제군과 충수절제군 간의 치료효과 단기 치료효과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Flum 교수팀은 "이번 연구로 맹장염에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치료가 수술치료 대비 비열등한 것을 알 수 있다.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충수절제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적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충수석이 있는 환자는 항생제치료 후의 합병증 위험이나 충수절제술을 추가로 받게 될 위험이 높았던 점도 명시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오리건보건과학대 Danny Jacobs교수는 NEJM 사설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선호되는 치료는 빠르게 통증을 해결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충수절제술일 것이다. 또한 항생제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환자에게 장기적 영향에 대한 교육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논하면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일부분 동의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