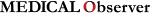18일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 열려
병원 내 의사결정과 윤리적 결정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병원에서 완화의료가 자리잡으려면 의사와 간호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위한 도덕적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은 과잉진료와 돌봄의 부재 사이에서의 불균형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병원에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이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를 주제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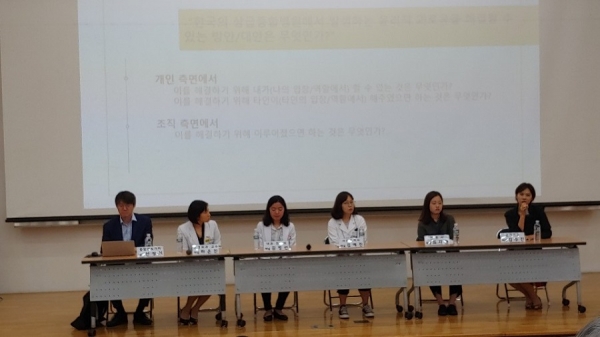
서울대병원 내과 김정선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임종 과정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서울대병원에는 교과서적 치료를 받은 환자뿐 아니라 임상시험까지 참여한 환자가 많다. 따라서 보호자들이 1%의 회생 가능성도 없냐고 물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임종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괴롭다"며 "의학적으로 불확실할 때 보호자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현장에서 의사들은 나의 판단 미스(misss)로 인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게 내벼러 두는 건 아닐까하고 우려한다"며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와 논의하는 입장이고, 의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 등이 있다"고 말했다.
임종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윤리적 괴로움도 발표됐다.
서울대뱅원 내과병동에 근무하는 최지현 간호사는 임종실은 임종 간호를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망과 사후처치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간호사는 "대부분의 환자가 임종실에 오자마자 사망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혈압 측정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매번 사망하는 환자를 보고 있어 간호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심지어 사후처리를 하는 전담간호사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임종실 부족, DNR 오더 못내리는 등 쇼피알도 힘들어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하과)는 우리 병원에서도 임종실 절대부족, DNR(심폐소생술하지 않기) 오더의 암묵적 의미, 말기돌봄에 관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못해 DNR 오더를 내리지 못하고 심정지를 맞이하는 쇼피알(Slow code) 등이 의료진의 스트레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환자 대부분이 다인실에서 죽음을 맞이해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임종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DNR(심폐소생술하지 않기) 오더의 암묵적 의미도 의료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말기돌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DNR 오더를 내리지 못하고 심정지를 받아들이거나, 의사와 간호사가 CPR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 중단해달라고 할 때까지 CPR을 약하게 하는 쇼피알도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윤리적 고민에 대해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박 교수는 "과나 병동단위 등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라운드/증례 토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사결정과 윤리적 갈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 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과밀과 의료진 업무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치료(Cure)와 돌봄(Care)의 기능에 따라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