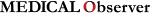[메디칼업저버 최상관 기자] 벚꽃 날리는 4월, 봄기운을 가득 안고 학회마다 학술대회 준비로 분주하다. 학술대회는 새로운 연구 결과, 최신 지견, 교육 등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 만한 여러 세션들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백미는 학회 가이드라인 발표다. 대개 책 한 권으로 형상화되는 가이드라인이지만, 개발에는 학회 여러 연구자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다수 연구자가 참여한 가이드라인 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최근 강조되는 다학제성을 갖추기 위해 유관 학회와도 협력한다. 개발 과정이 길게는 몇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학회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가이드라인은 임상 진료의 길잡이가 본연의 역할이다. 즉,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안내자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됐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임상에서의 안내자 역할보다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이는 측면이 있다. 실제 몇몇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항목의 급여 인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으로 현 보험 급여 기준과 맞지 않는 권고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A 학회 가이드라인 개정위원장은 "현재 급여화 되지 않은 조직 검사와 비침습적 검사의 보험 급여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비침습적 검사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B 학회 가이드라인 개정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병용 치료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해 급여 인정을 위한 설득 근거로 삼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현 급여 기준에 맞게 안내하는 알고리듬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학회 가이드라인이 보험 급여 기준에 앞서가고 있어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C 학회 기자간담회에서는 특정 항목의 급여 인정을 관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권고 항목은 확실한 연구 근거 또는 다수의 전문가 컨센서스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에 보험 급여 인정을 요구하는 데 가이드라인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때문에 학회의 입장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본연의 목적인 임상에서의 안내자 역할이 아닌 특정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된다.
앞으로 개최될 학술대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임상에서의 길잡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찾아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