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대 신찬영 교수 "환자 특징에 따라 소분류해 환자별 치료제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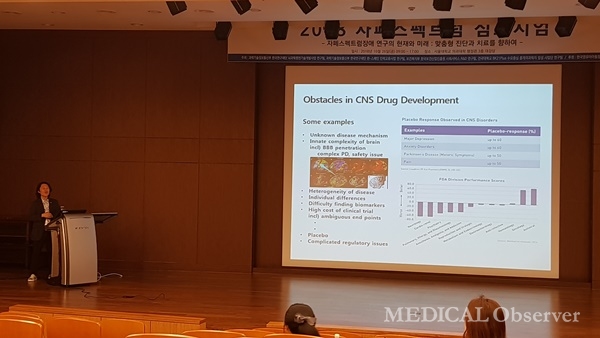
20년 안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이하 자폐증) 치료 신약이 개발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현재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지만, 환자 특징에 따라 소분류(subtype)해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모든 자폐증 환자에게 동일하게 투약하는 치료제 개발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국의대 신찬영 교수(약리학과)는 "30년 전에는 암환자 치료에서 정밀의료를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암환자 치료가 많이 바뀐 만큼, 자폐증 역시 5~10년 안에 치료제가 개발되긴 어렵겠지만 20년 안에는 반드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자폐스펙트럼장애 연구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자폐증 치료를 타깃으로 진행된 치료제 임상연구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올해 초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의약품(breaking through therapy)으로 지정된 '발로밥탄(balovapan)'이 자폐증 치료 신약으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주요 연구에서 자폐증은 바소프레신(vasopressin)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추정되지만 발로밥탄은 바소프레신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때문에 발로밥탄이 최초 자폐증 치료제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폐증 치료제 개발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신 교수는 자폐증 환자의 이질성(heterogeneous), 즉 환자마다 특징이 다르기에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로 흥분성 및 억제성 시냅스의 불균형[excitation/inhibitation(E/I) imbalance]은 자폐증의 핵심 발병 기전이지만, 환자마다 흥분성인지 또는 억제성인지 등 특징이 다르다. E/I 균형을 통해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을지라도 환자의 특징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기전이 다르다는 것.
결국 자폐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약을 투약하는 'One Size Fits All' 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자의 특징을 소분류해 환자별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이어 그는 자폐증 환자별 치료에 유전자형(genotype)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폐증 치료에서 환자를 소분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소분류와 관련한 가장 핵심은 유전자형"이라며 "앞으로는 암처럼 (자폐증 치료에도) 유전자 치료를 이야기할 것이다. 굉장히 빨리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폐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개인 맞춤형 임상연구인 'N-of-1 trial'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f-1 trial이란, 치료가 되지 않거나 궁극적인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대해 개인 맞춤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개념이다. 주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 질환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는 "N-of-1 trial은 환자에게 임상에서 처방하는 치료제를 투약하고 위약과 비교해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 주기로 평가하는 연구로, 최종적으로 치료제가 환자 개인에게 효과적인지를 볼 수 있다"면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지만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CNS 질환 분야에서 N-of-1 trial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